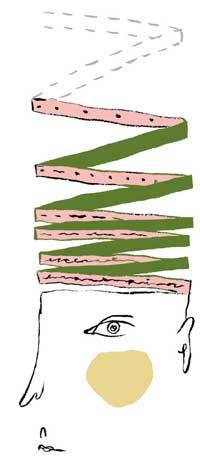● <마법성의 수호자, 나의 끼끗한 들깨>라는 소설의 후기에서 작가 복거일씨는 그 작품이 시간의 압제에 맞서는 사내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 사내가 시간의 압제에 맞서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억을 통해서다. 소설 속의 동화에 등장하는 한 노인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마법성은 기억이다. 아름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는 기억을 10분밖에 지속시키지 못하는 사내의 이야기다. 레너드 셸비라는 이 사내는 아내의 피살현장에서 누군가에게 각목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뒤 이런 증세를 얻었다. 이 사내가 아내의 살인범을 찾아 헤매는 얘기가 영화 <메멘토>다.
‘메멘토’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동사 ‘메미니세’의 명령법 2인칭 형태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고전어 동사의 명령법은 현대의 여러 유럽어에 명사로 차용되었다. 메멘토는 ‘기억을 돕는 물건들’을 가리킨다. 비망록, 메모지, 기념물, 유품 같은 것들 말이다. 메멘토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외친다. 나를 보고 무엇인가를 기억하라고. 예컨대 ‘졸리 로저’라고 불리는 해적기나 독약병의 라벨에 그려진 해골은 죽음을 머리 속에 담고 있으라고 외친다. 그래서 그것은 흔히 메멘토 모리(말 그대로의 뜻은 ‘네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불린다.
영화 속에서 레너드는 메멘토로 무장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가 만난 사람들, 자신이 마주친 건물들을 끊임없이 폴라로이드 사진에 담은 뒤, 그 사진에 피사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해 놓는다. 10분 뒤면 그 피사체들이 자신에게 완전히 낯설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자신이 기억해야 할 사건들을 꼼꼼히 메모한다. 특별히 중요한 일들, 예컨대 아내를 살해한 자를 잡아야 한다는 사실 같은 것은 아예 자기 몸에 메모한다. 어떻게? 문신으로. 10분짜리 기억력의 레너드가 수많은 메모지, 사진, 문신들로 시간과 싸우는 모습은 문자의 발명 뒤에 인간의 기억력이 크게 쇠퇴했다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상기시킨다. 물론 레너드의 경우는 선후가 바뀌었지만. 즉 그가 남서광(濫書狂)이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나빠져서 남서광이 된 것이지만.
영화 속에서 레너드가 아내의 살인범에게 복수를 했는지는 모호하다. 그는 적어도 두 사람을 죽이지만, 그 가운데 범인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사실 레너드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에게는 10분의 기억밖에 없기 때문이다. 메멘토 바깥에서, 그에게는 10분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는 10분마다 새로 태어난다. 그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에게 시간은 정지해 있는 것과도 같다. 현실은 늘 그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현실은 오직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레너드가 앓고 있는 장애는 정도를 달리해서 모든 사람이 겪는다. 시간과 기억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늘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장 슬픈 일들을 포함해서- 언제까지라도 기억한다면, 그는 이내 미쳐버리고 말 거다. 그래서 <마법성의 수호자, 나의 끼끗한 들깨>의 주인공 도린은 어느 순간 자문한다.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기억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은? 이 우주의 냉엄한 법칙이 어느 순간에 문득 보여준 너그러운 면은 아닐까?’
나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더 낮은 차원에서 기억의 한계 덕을 보고 있다. 내게는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이 40여권 있는데, 물론 내가 오래 전에 다 읽은 책들이다. 그러나 크리스티의 책을 펼 때마다 나는 그 책을 처음 대하는 듯 흥분과 기대로 마음이 설렌다. 예전에 읽은 내용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이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의 많지 않은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제한된 수효의 책(이나 비디오테이프)으로도 늘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망각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 과오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과오를 반복한다. 그리고 망각하는 자는 늘 속임을 당한다. 영화 속에서 레너드가 테디에게, 그리고 아마 나탈리에게 속임을 당하듯. <조선일보>의 과거를 잊은 우리가 <조선일보>에 계속 속임을 당하듯.
영화 속에서 레너드가 불행한 것은 아니다. 10분밖에 지속되지 않는 그의 기억은 남들로 하여금 그를 속이게도 하지만, 그 자신으로 하여금 남과 자신을 다 속이게도 한다. 그의 기억력 결핍 때문에 그는 자신의 기억을,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현실을, 멋대로 통제할 수 있다. 기억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메멘토를 남김으로써. 그가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기록해도 10분만 지나면 그것은 진실이 된다. 어떤 불쾌한 경험도 10분만 지나면 끝이다. 남는 것은 메멘토를 통해 선택된 ‘아름다운’ 기억뿐이다. 레너드가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그를 부러워해야 할까?
고종석/ 소설가·<한국일보> 편집위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