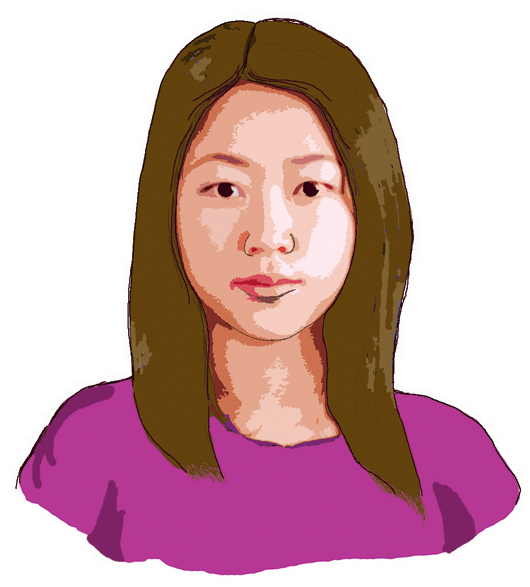영화를 보는 게 일이다보니, 영화를 보는 ‘환경’에 민감한 편이다. 그게 강남 모 극장 몇관이라는 식으로, 음향과 화질을 따진다는 뜻도 아니고, 가운데 통로쪽 하는 식으로, 좌석을 가린다는 말도 아니다. 요즘은 개봉관이든 시사회든, 극장에 들어설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영화를 볼 수 있길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 ‘폭탄’을 피하는 법. 그것을 궁리하면서.
극장에서는 영화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종종 펼쳐진다. 대부분은 휴대폰 때문이다. 소중한 시간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는 이동통신 카피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휴대폰을 끄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영화를 보면서도, 전화를 걸거나 받아야 하고,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야 한다. 남에게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행동들이 민폐가 된다고 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까지 그 낭랑한 벨소리와 눈부신 액정 조명을 견뎌야 한다고, 그래도 된다고 믿는 것 같다. 늦게 들어와서 좌석 확인을 한다고, 휴대폰 액정을 손전등처럼 비추고 다니는 대담무쌍한 행태도 종종 접하게 된다.
개봉관은, 기자 시사회 풍경에 비하면, 그래도 점잖은 편이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런 경우다. 영화 상영 중이다. 전화벨이 울린다.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시사회 중이거든요. 2시간 뒤에 다시 전화주세요.” 용건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걸, 왜 굳이 전화를 받는 걸까. 꺼두면 중요한 전화를 놓칠 수도 있다? 숨이 턱, 막힌다. 두어 시간 영화 보는 중에 걸려오는 전화를 한통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강박 혹은 조급증. 이 일에 필요한 기질과 근성이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다. 이런 타입은 그래도 매너가 좋은 편에 속한다. 영화를 보다가, 결코 작지 않은 목소리로 ‘업무 처리’를 하는 사람들도 본다. 자료를 받았네 못 받았네, 시간이 나네 안 나네, 하는 얘기들을 태연하게 주고받는다. 어떤 이들은 목소리를 낮추거나, 서둘러 끊는 법이 없다. 그들의 당당한 목소리는 “알잖아, 나 잘 나가는 기자야, 선수들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하나” 하는 식으로, 동의를 강요한다.
또 하나 거슬리는 건 웃음소리다. 코미디영화를 보면서, 다 함께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릴 때는 나름의 카타르시스가 있다. 문제는 코미디가 아닌 영화, 전혀 우습지 않은 대목에서, 픽픽 터져나오는 웃음들이다. 여기엔 대개 ‘조롱’이나 ‘과시’의 의미가 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장면에서 히스테리컬한 웃음을 흘리거나, 생뚱맞은 대목에서 혼자 심오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읽어냈다는 티를 내는 과시의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주의가 산만해선지, 성격이 나빠선지, 그런 순간들에는 영화가 안 보이고 안 들린다. 더 큰 소란이 벌어질까봐 어필 한번 변변히 못하는 소심한 인간인 까닭에, 극장이나 시사회장에서 자리를 잘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주변을 면밀히 관찰해서 ‘요주의 인물’을 발견하면, 될수록 멀리 떨어져 앉는 게 영화 관람에도 정신 건강에도 이롭다. 영화에 대한 예의는 접어두더라도, 사람에 대한 예의는 지키고 살았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