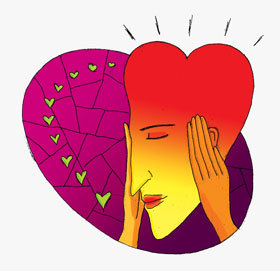이명세 감독의 <지독한 사랑>의 주인공 김갑수는 부인에게 연구논문을 쓸 게 있다고 하고 집을 나와 강수연과 외진 바닷가에 딴살림을 차린다. 강수연은 거기서 출퇴근을 하고, 겨울방학을 맞은 교수 김갑수는 살림을 돌본다. 하루는 그가 동네 가게에 가서 번개탄을 산다. “아줌마, 번개탄 하나 주세요.” 난 이 말을 “아줌마, 멍게탕 하나 주세요”로 알아들었다. 아, 저런 외진 바닷가는 가게에서 멍게탕도 파는구나, 생각하고 멍게탕이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해서 가게를 나오는 김갑수의 손을 유심히 봤다. 김갑수는 냄비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난 내가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집에 돌아온 김갑수가 가스불을 켜는 대신 연탄아궁이 뚜껑을 여는 걸 보고 나서야 김갑수가 멍게탕이 아니라 번개탄을 샀다는 걸 알았다.
후배랑 이런저런 잡담을 나누는데, 그 후배가 자기 대학 시절에 알았던 여자 후배 얘기를 꺼냈다. 그 여자 후배가 노래를 엄청 잘했는데 얼굴도 정말 예뻤다며, 가수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근데 그 여자애가 한총련에 빠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 난 이 말을 “근데 그 여자애가 한 청년에 빠지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로 알아들었다. 아, 대단한 사랑을 했구나, 생각하고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후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중엔 구치소도 몇번 가고 수배도 당하고….” 난 그 청년이 강도짓이라도 하는 남자여서 여자가 자기 연인을 돕다 피해를 당한 걸로 이해했다. 얘길 듣다보니 여자가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물어봤다. “세상에…. 그 청년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는데…?” “뭐가요…?”
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편이다. 많이 못 알아듣는다. 내가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입사 초기에 주위 선배들은 내가 일부러 그러는 줄로 오해도 많이 했다. 사람 말귀 못 알아듣는 애가 인터뷰도 하고 영화도 본다고, 선배들은 지금도 가끔 신기해한다. 실은 나도 자막없는 국산영화보다 자막있는 외화 볼 때가 훨씬 편하다. TV에서 외화를 더빙해주면 물속에서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갑갑할 수가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가끔 생각해보면, 내 생각에만 너무 집중해 살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흔히 ‘집중 잘한다’고 말할 때의 그 집중이 아니라, 내 의견, 내 판단, 내 느낌을 지나치게 믿는다는 뜻이다. 그러다보니 상대방 언행의 맥락을 파악하는 일에도 자연히 게을러진다. 원만한 의사소통이 좀처럼 쉽지 않은 이 귀머거리 같은 태도는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 특히 심해진다. 끓는 물을 쏟아붓듯 즉각적이고 분명해야 사랑이라고 믿는 나는, 심지어 귀까지 먹어서, 사랑을 할 때마다 굉장히 일방적으로 열병을 앓는다. <지독한 사랑> 속 지독한 그 사랑이 바로 나같은 사람의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 좋지만 사실 괴롭다. 내가 사람 말귀를 좀더 잘 알아듣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랑을 해도 덜 괴로웠을까. 어른되는 게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요즘 드는 생각이다.